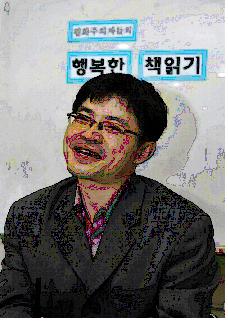1. 선하고 약한 것들은 의로운데 패배만 하는…
우리는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학번은 같다. 기왕에 몇 번을 만난 터이기도 하고 경험이나 생각도 통하는 게 많아 서로 편한 친구로 지내도 좋은 사이인데, 또 그렇게 맘 편하게 지내기에는 이계삼 선생이나 나나 ‘과도하게’ 진지한 면이 있다. 특히 내게 그는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그만의 감성적인 문체로 교육 현장의 고통을 그려낼 때, 그리고 현재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이미 사람이 죽었고 또 죽어나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밀양에 대해 절규할 때, 내게 그의 목소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들린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것이 꼭 신에게 드리는 말처럼 들린다고 할까.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처음엔 개인적인 이유에서였다. 미국에 나가 있을 때 그가 학교를 그만둘 것 같다는 소식을 다른 선생님에게 들었다. 사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얼마나 교직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 내가 울산의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을 때 그는 밀양에서 아이들과 봉고차를 타고 왔다.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도, 출국 전 어느 강연 자리에서도 나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표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를 보았다.
언젠가 그는 글에서 자신이 교직을 택한 계기를 짐작케 하는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다. 1992년 무렵이었나보다. 그때 캠퍼스에 전교조 사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계삼선생이나 나나 소위 전교조 1세대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우리 곁에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사건을 경험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캠퍼스에 걸린 교사들의 사진을 보았다고 했다. 해직되어 교문 밖으로 밀려난 선생님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아이들, 때로는 끌려가고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던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 앞에서 그는 나즉히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투사가 될 자신은 없었지만 저 선생님들처럼 사랑 때문에 고통 받는 교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내게 전해왔다. 나중에 귀농대학을 지역에 만들어 거기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가난하더라도 자립적인 소농 중심의 마을을 꿈꾸던 그였기에, 귀농대학 이야기는 내게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 다만 내가 궁금했던 것은 그가 어떻게 아이들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지만 귀국하면 꼭 만나봐야지 했다. 그 결심을 들은 지 얼마되지 않아 그는 밀양의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소식을 전하며,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는 어느덧 분신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나온 선로를 떠받치는 송전탑에 반대하면서, 탈핵운동의 복판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귀국 후 이일 저일에 정신이 팔려 그를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계속 묻어두고만 있었다. 그러다 <위클리 수유너머>에 그가 쓴 칼럼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1년간의 칼럼 연재를 마치며 쓴 것이었는데 그는 글의 한 대목을 이렇게 적었다. “선하고 약한 것들은 늘 이렇게 아름다운데 언제나 패배하기만 한다.” 뭔가, 알 수 없지만 그를 빨리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2. 투사가 될 순 없지만 고통받는 교사는 될 수 있었는데…
밀양역에 내려 마중 나온 그를 만나자마자 호출이 왔다. 지식경제부 관료 한 사람이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급히 와달라고 대책위에서 보낸 호출이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움막을 치고 농성 중인 어르신들을 만나게 했다. 한 목소리라도 더 전하려는 듯,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 이야기를 듣게 했다(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호 <위클리 수유너머> ‘밀양765kv’를 참조하시길). 그 어르신들을 만나러 걸어가는 도중에 또 밥을 먹으면서 그와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집에 들렀을 때 나는 그가 수업에서 사용한 교재를 발견했다. 다양한 읽기자료와 생각할 거리 등이 빼곡히 정리된 그 교재를 보고는 물었다.
고: 선생님은 수업에 교과서를 쓰지 않나봅니다.
이: 네, 저는 제가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고: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읽히셨네요?
이: 선생님도 언젠가 ‘독서 -책으로 만나는 사건’ 쓰셨잖아요. 그것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고: 선생님 기억하세요? 울산에서 제가 ‘앎이 삶을 구원하는가’라는 강연을 할 때 어느 여학생이 물었잖아요. 자기 오빠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오빠에게도 앎이 삶을 구원할 수 있냐고. 최근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우리 ‘앎’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의 형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어둠’ 같은 게 있어요. 언젠가 장애인 야학에서 수업을 할 때 정신장애가 있는 분이 잠깐 수업에 참여했었는데요. 그 분이 어떤 주장을 펼 때 처음 한 삼십 초 정도는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알 것 같았는데, 1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버리세요. 제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그 분을 그냥 꼭 안고는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분은 그래도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고, 또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권익을 찾는 운동에 나선 분이었는데도요. 선생님이 언급하신 글, ‘독서 -책을 만나는 사건’은 어찌 보면 제가 만난 긍정적 사건이랄까, 어떻든 어떤 밝은 면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야학에서 수업을 하며 느낀 놀라운 사건들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글을 한 편 더 써야 할 겁니다. 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하여, 심지어 ‘사건’조차 경험할 수도 없었던 어떤 ‘어둠’에 대해서요. 언젠가는 쓰고 싶기도 하고 알아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무력했던 적이 없어요.
이: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꼭 좀 밝혀주셨으면 해요.(웃음)
고: 그나저나 이렇게 훌륭한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교육을 하셨던 분이 도대체 교직을 왜 그만둔 겁니까?
이: 좀 비겁한 이야기인데, 도망쳤다고 해야할지, 어떻든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를 테면 성적을 조작이랄까, 어떻게 부정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았거든요. 지역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걸 맞추려면 1학년 때에 내신이 좋은 친구들에게 내신을 마져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내신 1등급이 쭉 유지되어야 하니까. 일제고사도 그렇고. 게다가 학교에서는 수시접수를 할 때 쯤 되면 수업을 하지 않고 엘리트 학생들에게는 그냥 논술만 하라고 해요. 학교 관리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야자나 두발, 보충수업,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할 때도 그랬고요. 사실 여기 아이들 반 이상이 시험을 치면 그냥 자요. 그런데도 돈 만원씩 걷게 해서 사설 모의고사보고, 선생들은 그때 받은 돈의 일부로 회식을 하고. 저희반은 원하는 사람만 모의고사 치게 하는데, 네다섯 명 시험을 치죠. 다른 반은 모두 다 보는데.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런 싸움이 아이들에게 알려진 거죠. 아이들에게 저는 뭐 의리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본의 아니게 다른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고요. 선생님들 눈에는 제가 동업자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사실 저는 어느 쪽도 아닌데요.
고: 힘드셨겠어요.
이: 여기 동네 나가면 졸업생들, 제자들 많이 봅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에요. 이십대 중반이되서도 말이죠. 얼마 전에는 딸기 좌판을 하는 졸업생도 봤고, 인터넷을 집에 달아주는 기사노릇을 하는 여학생도 보았어요. 내가 교사를 하면서 ‘우정’이 어떻고, ‘힘을 내자’ 뭐 그런 식의 말을 햇는데, 내가 설령 선의로 그런 말을 했다해도 그게 사기는 아니었을까 싶어요. 3-400만원 월급을 받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현실이 아닌 희망을 말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을 그만두고 농사라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래, 함께 농사라도 짓자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학교에서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게 옳지 않았나 싶기도 하죠. 힘들어서 도망쳤어요. 계속 싸워야 하는데….(한숨)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 전까지는 글도 참 어둡게 썼는데 말이죠. 교사집단의 윤리랄까, 사실 교사는 안정적 중산층 아닙니까? 이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앓는 소리를 하는 것, 그게 듣기 싫었는지도 모르죠. 모두가 자기 몸 팔아서 겨우 사는 세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