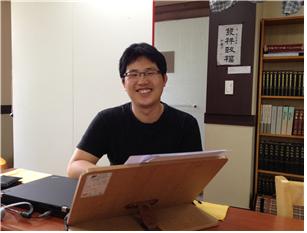최진호 선생님은 오랫동안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지금은 수유너머 문에서 공부하며 지내십니다. 요즘은 개화기 신문과 잡지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에 대해 연구 중 이십니다. 이번 여름강의에서는 <플라톤, 자기와 타자의 변신- 에로스의 활용> 과 <에피쿠로스, 자기배려의 자연학- 느낌의 공동체>를 강의하십니다. 수유너머 문에서 공부하며 지내시는 최진호선생님을 만나 이번 여름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어보았습니다.
————–
Q. 이번 강의주제가 ‘자기 계발시대의 자기 돌봄’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 로마 시대와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과 만나야한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최진호 : 푸코를 공부하다가 후기 저작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후기 저작에서 자기 배려, 자기 통치, 용기를 다루는데 그것을 읽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푸코의 관점에서 그리스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스 시대를 어떻게 다시 이해해볼 수 있을까’싶었어요. 그리고 푸코가 말하는 자기돌봄을 통해 요즘에 이야기되는 자기계발에 다르게 접근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푸코의 관점에서 그리스로마시대를 본다는 것은 뭘까?”
“단순히 자기계발을 해야한다고 말이 되는데.. 자기계발과는 다른 ‘자기돌봄’이란 뭐지?”
Q. 그동안 그리스 로마 시대에 관한 책들은 어떻게 읽어오셨나요?
최진호 : 3년전부터 세미나를 해왔는데요. 세미나의 기본은 그리스 철학을 다룬 현대철학자들의 글을 봤어요. 그리고 이 글들을 자기돌봄과 접목시키며 책을 읽어왔어요. 첫 번째 대상이 푸코였던 것이고요.
그리스 철학을 살펴보며 그리스 시대가 더 좋았고, 지금이 더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의 자기 돌봄이라는 것하고 우리시대의 자기돌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다면 무엇이 같은지 살펴봤어요. 푸코식으로 말하면 자기돌봄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치들 안에서 나타나는 주체화 과정의 한 양상일테니까요.
그리스 시대의 철학.. 푸코.. 자기돌봄.. 지금.. 우리는!
Q. 자기돌봄이라는 것이 우선 자기 것을 챙기고 남에게 베푼다? 는 것인지.. 남들에게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는 것을 안다? 는 것인지.. 자기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최진호 : 자기돌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그것은 답처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오히려 자기돌봄의 장치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정에서 자기를 돌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연애에서의 자기돌봄, 공부에서, 운동에서 자기를 돌보려는 방식이 있을 꺼예요. 그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모였을 때, 그려지는 겹침들이 자기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돌봄은 여러 가지 실천의 과정들 안에서 드러나는 역량들의 총합들이예요. 자기돌봄의 글쓰기, 자기돌봄의 밥하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기돌봄에 대해 말한다면 이러한 실천들에 있어서 지향점이나 공통분모를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상반된 것들이 자기돌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자기돌봄의 장치들이예요. 고대그리스라는 조건에서는 자기돌봄과 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것들 말이죠.
자기돌봄은 다양한 실천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
자기돌봄의 공통분모를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을까!
Q. 국가나 사회와 자기돌봄과는 관련이 있나요?
최진호 : 네, 가능해요. 법이라는 것조차도 자기돌봄의 형태로 삼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야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의 것으로 가능해요. 법이 물길이잖아요. 삼수변에 가다거. 사람들이 길을 가기위해 만들었던 삶의 준칙들을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자유로운 것들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좋다’라는 것으로 흐르게 하잖아요. 훈육시키기위한 법 대신에 자율성을 길러내는 형태로서, 규칙이나 리듬으로, 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Q. 두 번째 강의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에로스의 활용”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생각이신가요? 조금 들려주세요.
최진호 : 파이데이아를 보면 사랑의 다른 형식을 찾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아이를 단순히 이뻐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과 관계맺고 있는 이 아이에게서 내가 보았던 이데아세계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아이를 북돋어줘요. 얘를 돋구어주면서 자기가 꿈꾼 이데아의 세계로 다가가며 스스로를 단련시켰어요. 그런 과정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반성의 길로 삼았던 것이지요.
꼭 이데아 때문이 아니었다고해도 가능했다고 봐요. 자기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파이데이아에서는 사람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이가 나뉘어져 있어요. 나이나 지혜에 따라서요. 강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사랑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구나 이야기나눌 수 있을 꺼예요.
Q. 훈육과는 다른 느낌이예요…
최진호 : 훈육은 틀에 맞춰서 대상을 모듈화하는 것이잖아요. 시간의 엄수라든가. 동작의 균질화라든가 하는 장치들을 통해서요. 에로스의 관점에서는 아이가 얼마나 자기 관계성 안에서 사람들과 더 잘 관계맺을 수 있을까. 얘가 통치자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얘한테 좋은 것을 북돋아 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이야기돼요. 다만, 사랑받는 애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그때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길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것이죠.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시대의 사랑..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사랑이란!
Q. 마지막 강의에서 ‘느낌의 공동체’라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공동체에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요즘 연구실에서 음악을 틀어놓으시는 이유가!^^)
최진호 : ‘느낌의 공동체’는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자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찰이었어요. 원자론자들은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했는데 이것이 인식하는 것, 관계맺는 것과도 접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돌봄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관성이 있어요. 원자들하고 관계맺는 방식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맺는 방식하고 어떻게 같았을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느낌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원자론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자기 계발에는 어떤 사랑과 우정이 있나요, 자기 계발에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리스 로마시대인들의 실천으로 자기 돌봄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