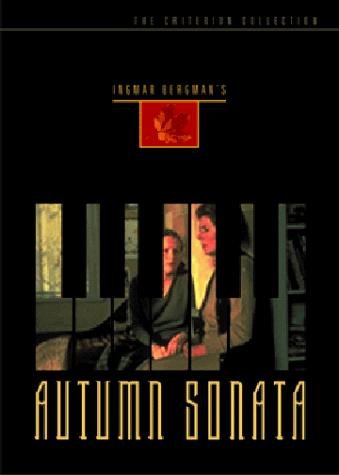 <가을 소나타 Hostsonaten / Autumn Sonata. 출처: IMDb>
<가을 소나타 Hostsonaten / Autumn Sonata. 출처: IMDb>
한 여자가 피아노를 친다. 그녀는 쇼팽을 연주하고 있다. 시선은 불안정하게 악보와 건반을 오가고 박자 역시 엇나가는 것 같다.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서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는 뒤에 있는 여자를 의식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치는 선율은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어쩐지 본래 실력보다 못하게 치는 것 같다. 뒤에 앉아 있는 깐깐해 보이는 여자의 눈에는 아주 잠깐 눈물이 고이려 하지만 이윽고 그녀는 눈을 감아 버린다. 왜인지 우리는 피아노를 치는 여자의 심경이 되어 그 뒤에 앉은 여자의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는데, 좋은 듯 심기가 불편한 듯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연주가 완전히 끝나고서 둘 사이에 이런 대화들이 오고간다.
-사랑스러운 것.
-그게 전부예요?
-아냐, 감동했어.
-정말요? 곡이 좋았어요?
-네가 좋았어.
…
-지적해 주세요.
-잘못한 거 없다.
…
-벌써 화내고 있잖니.
-평가할 가치도 없다구요?
<가을 소나타>의 에바는 피아니스트 어머니를 둔 딸이다. 중년은 되어 보이는 에바(리브 울만)의 모습은 이마 주름이라든가, 이미 나름대로 안락한 가정을 꾸린 상태라는 조건들과 다르게 꽤 유아적으로 보인다. 땋은 머리와 얇고 지나치게 둥그런 테 안경, 어딘가 불안해보이고 안절부절못하는 행동들이 그렇다. 7년 만에 엄마가 방문하자 에바는 ‘왜 온 거야? 왜 이제서?’라면서도 그 말들이 더욱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에바의 엄마 샬롯(잉그리드 버그만)은 18년 만난 연인의 죽음을 상당히 극적인 모습으로 슬퍼하다가도 취리히에서 싸게 잘 구매한 옷에 대해 얘기하는, 어쩐지 무심하면서 감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연주 장면> 뒤에 이어지는, 위태롭고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듯한 대화가 끝난 뒤 샬롯은 악보대를 내려 버리고는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치며 에바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 준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눈을 감고 쇼팽을 연주하는 샬롯의 옆모습을 에바는 정면에서 아픈 눈으로 바라본다. 베리만은 한 사람이 정면으로 상대방의 옆얼굴을 보는 식의 화면 구성을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둘의 시선은 절대 만나지 못한다. “전쟁같이 시작해서 승리로 이끄는” 듯이 연주하라는 샬롯의 말은 자기중심적인 엄마와 상처받은 자식 간의 불화의 시절을 생생하게 압축한다.
<산딸기> <페르소나> <화니와 알렉산더> 등으로 유명한 감독 베리만이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모에 대한 혐오는 아주 오랫동안 베리만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애증에 가깝다. 참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그는 아예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떨쳐내지도 못했다. 상처가 만들어진 시점이 과거인데 그것의 영향은 현재진행형인 경우 대개 그것들은 더 뒤틀려 파괴적인 것이 된다. 그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 또한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해서 더 괴롭도록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베리만 개인의 상처의 크기를 짐작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의 고통을 우스운 것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말년에 가서 베리만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때 부모와 그의 위치는 전도되었다. 마치 중년의 에바와 노년의 샬롯이 7년 만에 만났을 때처럼, 성인이 되고도 몇 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부모는 사랑을 갈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성인 베리만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어머니가 죽은 뒤 어머니의 꿈을 꾸며 하고 싶었던 말을 죄다 내뱉던 것을 회고한다.
“화초들은 잘 자랐는데 ‘우리는요?’ 왜 모든 게 이토록 비참한 지경이 됐죠? 베리만 집안의 무기력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건가요?”…“형은 왜 병약자가 됐지요? 동생은 왜 그토록 짓눌려서 절규하게 됐을까요? 저는 왜 온몸에 불치의 감염된 상처를 지니고 살았을까요?”…“그저 우리가 저 덧없는 사회적 위신의 이면에서 왜 그토록 끔찍하게 불행해졌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마법의 등>. 그는 어머니의 상을 만들어 내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마구 쏟아낸다. 참 집요하지 않은가?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추적하고, 작품에 새겨 넣고, 다시 싸움을 붙인다는 이 과정이 말이다. 위의 회고는 정확하게 그의 영화와 닮아 있다. 이미 있는 대로 찢어진 관계의 인물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서로에게 폭언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미 베리만의 부모들은 늙어 버렸고, 불행히도 그 자리에 없거나 지쳐서 베리만을 받아 주지 못한다. 이때 그가 느꼈을 절망감이 쉽게 상상된다.
그가 회고하는 대로라면 베리만 감독 개인의 삶은 분명 파괴적인 부분이 있다. 그의 형제들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 맺었다고 하듯 베리만도 그랬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언제나 주인공들이 갈등의 정점에서 만나 남김없이 ‘다 부숴버리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리고 대개 싸움의 끝에서 어떤 결말도 보여 주지 않은 채 영화는 끝난다. 내가 집요하게 베리만의 삶에 대해 반복해 말하는 이유는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 어린 시절, 불행을 끈질기게 탐색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점 때문이다. 삶의 문제의식과 상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영화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한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베리만의 작품에서 가족 간의 트라우마를 다룬 영화는 많다. <산딸기>에서 3대에 걸친 냉소적인 가족이 그랬고 <외침과 속삭임>의 세 자매가 그랬고 <페르소나>의 어머니와 아들은 아주 명시적으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어린 베리만을 상상하게끔 한다. <가을 소나타>의 모녀 역시 그렇다. 샬롯이 잠을 자는 장면에서 시계 소리가 아주 부각되는데, <산딸기>의 꿈 장면이 연상된다. 시계 소리는 점점 큰 소리로 울리지만 시계 바늘은 멈춰 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 혼동된 기억을 가진 채, 베리만 영화의 인물들은 만난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완전한 화해도 아니고 완전한 결별도 아니다. 다만 상처를 쏟아낸 사람들은 아마도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다시 상처의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서로의, 그리고 각자의 상처를 직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리만이 추구했던 바는 정확하다. 덧난 상처로 뒤틀린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는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창조의 지점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자기 파괴/가식에서 벗어난다. 작품들 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끌어낸 질문을 작품에 녹인 작업 방식 역시 파괴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의 질문들은 이렇게 생성으로 되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