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경지기의 책 이야기 3
–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이왕주, 효형출판
지난 겨울방학, 풍경 아이들과 서울여행을 떠나 ‘수유너머 남산’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날 고병권 선생님은 풍경 아이들에게 연구소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곳은 더 이상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수유너머에 계신 분들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나에게도 이런 공간이 있다. 지금은 없어진 곳. 예전 근무했던 학교 건물이 몇 년 전에 사라졌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낡은 학교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세운다고 했다. 2002년, 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 1학년을 맡았다. 이 아이들과 허물기 전의 낡은 건물에서, 가건물에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다. 교복을 입었다기보다 교복 속에 몸을 넣은 것 같았던 아이들이 점점 자라 교복 바지 허리가 작아 잠그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 아이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2005년 2월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지 일년이 되던 때였다. 건물을 헐기 전, 나는 우리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을 담기 위해 시간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생활했던 건물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나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우리 교실이었던 3학년 5반 교실이었다. 우리반 아이들이 졸업한 후 새로운 1학년들이 그 공간에서 생활했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아이들은 달라졌지만 예전 아이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우리반 급훈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고 교실 뒤 벽에 남아있는 ‘박노광 골리앗, 김이수 바보’ 등의 낙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보듬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1학년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면 나는 교실을 돌면서 우리 아이들이 남겨놓은 낙서를 나를 위해 남겨놓은 선물인 듯 여기며 바라보곤 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 학기 동안 불면증을 겪기도 했다.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그해 가르치던 1학년 아이들을 가슴에 제대로 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이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 여겼다.
2005년 2월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지 일년이 되던 때였다. 건물을 헐기 전, 나는 우리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을 담기 위해 시간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생활했던 건물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나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우리 교실이었던 3학년 5반 교실이었다. 우리반 아이들이 졸업한 후 새로운 1학년들이 그 공간에서 생활했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아이들은 달라졌지만 예전 아이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우리반 급훈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고 교실 뒤 벽에 남아있는 ‘박노광 골리앗, 김이수 바보’ 등의 낙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보듬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1학년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면 나는 교실을 돌면서 우리 아이들이 남겨놓은 낙서를 나를 위해 남겨놓은 선물인 듯 여기며 바라보곤 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 학기 동안 불면증을 겪기도 했다.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그해 가르치던 1학년 아이들을 가슴에 제대로 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이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 여겼다.

‘철학’은 삶이다. 치열한 삶 속에서 건져올린 사유이다. 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철학’은 보통 삶과 유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저 학문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현실에서 생활하는 나와는 거리가 먼 분야로 여긴다. 나도 그렇게 여겼다. 그때까지 철학서는 물론이거니와 철학으로 이끌어주는 책조차 읽어보지 못했었다. 그런 내게 이왕주 선생의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는 철학이라는 세계로 이끄는 손을 내밀었다. 이왕주 선생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철학적 사유를 꺼내놓는다. <트루먼 쇼>, <슈렉>, <집으로>, <매트릭스>, <중경삼림>, <와호장룡>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속에서 철학적 사유를 끌어내며 그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철학이 결국 삶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 내게 이 책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보았다.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된,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짚어준 글은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을 통해 니체의 ‘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다. 영화 속 두 남녀는 현재를 보지 못한다. 경찰관 633은 떠나간 사랑을 부여잡고 있어 현재를 보지 못한다. 그를 사랑하는 아비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흥얼거리며 미래를 붙들고 있느라 현재를 보지 못한다. 현재를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사랑은 비껴간다. 이왕주 선생은 이 두 인물의 삶을 니체의 철학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지나간 과거를 망각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않는 ‘어린 아이의 정신’으로 현재를 살아야 함을 이야기한다. ‘지금, 여기’에 발 딛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 글은 그 당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때 나는 ‘지금, 여기’에 발 딛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탓을 새로 만난 아이들에게 돌렸다. 새로 만난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정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지금, 여기’에 발 딛지 못한 나에게 새로 만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있을 수 없었다.
이 글 외에도 이 책의 모든 글들이 ‘지금, 여기’에 발 딛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춤추고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함을 이야기한다. 니체, 들뢰즈, 하이데거를 나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보잘 것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응시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올해 또다시 학교를 옮겼다. 2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종업식을 한 후 밤늦게까지 학교에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짐을 챙겼다. 전화벨이 울렸다. 승호라는 아이였다. 집에 돌아가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내 생각이 났다고 했다. 그동안 고마웠다며 인사를 했다. 나와의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기억해주는 승호가 무척 고마웠다.
학교를 나서면서 정든 공간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 묻혀있지만 내게는 곳곳이 환한 공간이었다. 운동장에선 골대마다 두세 명의 골키퍼가 지키고 있고 공격수들은 서로 자신에게 공을 달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마다 멋진 벚꽃 잔치을 보여주던 교문 진입로에선 아이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일 듯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 ‘허전함’, ‘안타까움’이 담긴 시선은 아니었다. ‘지금, 여기’에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아이들과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 풍경지기 박혜숙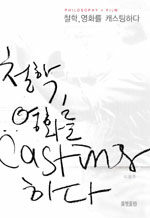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급훈 본 일이 없어요. 제 고등학교 때 급훈은 무미건조한 ‘최선을 다하자’, ‘성실’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나저나 교실 풍경 정겹네요. 물론 전쟁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