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맞이의 책꽂이
– <잘 커다오, 꽝꽝나무야>권영상 시, 신철 그림 / 문학동네
시는 만드는 게 아니란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단다. 찌릿, 감전된 듯 촉이 와서, 주르르 뱉어내는 게 시란다. 그렇다면 요리 조리 글 한 줄 쓰는 일에도 부산한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시는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시를 읽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겠다. 일찌감치 영악하게 전략적 제휴를 한 셈이다.
강아지만 모르게
코딱지를 돌돌돌 말아서,
꼭꼭꼭 눌러서, 빈대떡처럼 꼭꼭꼭 눌러서, 그래선 강아지 밥그릇에 뚝뚝뚝 수제비처럼 뜯어 넣었어. 그랬더니 강아지가 밥을 먹다 말고 그러잖겠니.
오늘은 밥이 짭짤한데, 왠지 간이 맞어.
몇 년 전 아주 좋은 동시 한 편을 만났다. 권영상 시인의<강아지만 모르게>라는 동시다. 처음 읽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하하!’ 소리 내어 웃었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어눌한 강아지가 안쓰러워 눈을 조금 흘겼던 것 같다. 그러고도 몇 번을 더 읽었다. 눈으로 볼 때보다 입으로 종알종알 거릴 때 훨씬 더 감칠맛이 나서, 읽고 또 읽었다.
이 시를 읽고 어떻게 강아지에게 코딱지를 먹이느냐고, 동물학대라고 핏대를 올린다면 그건 정말 오버다. 이 시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솔직히 드러낸다. 코딱지를 갖고 하는 아이의 장난을 좀 보라! 신의 손을 가진 유명 요리사의 행위처럼 정성스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돌돌돌 말고, 꼭꼭꼭 누르고, 뚝뚝뚝 뜯어 넣고. 게다가 이 요리사는 세심히 손님의 반응까지 살핀다. 자신과 다른 종인, 이질적인 손님의 말까지 알아듣는다. 간이 맞아야 밥이 맛있듯이, 유머는 우리 삶을 훨씬 활기차게 한다. 강아지만 모르게 벌어지는 어린 요리사(화자)의 고백이 유쾌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우산 받어
생쥐가
소낙비를 맞습니다.자, 이 우산 받어.
호박순이
호박잎 한 장을
쑥, 내밉니다.
<강아지만 모르게>에서 살며시 드러났던 아이(시인)와 강아지의 유대는 <이 우산 받어>에 가면 조금 더 잘 드러난다. 잽싸고 영리한 생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여리디 연한 호박순이다. 호박순에 호박잎이 매달린 자연적인 이치를, 시인은‘쑥’이라는 단어를 통해 타자를 향한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해 낸다. 내어준 호박잎이 있던 그 자리에 어쩌면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호박순은 비를 맞는 생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주는 마음이다. 내가 가진 것을 주저 없이‘쑥’내미는 거.
바람은 착하지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훌훌훌,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데굴데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 준다.그러고는
힘내렴!
딱 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바람은 착하지>는‘선물’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진정한 선물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주었다고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것인 듯‘툭’건네준다. 바람은 구석진 응달에 있는 어린 민들레꽃의 형편까지 헤아린다. 그에게로 가는 마음을 신문지에 담는다. 하지만 행여 상대방이 불편해 할까 봐, 민망해 할까 봐 선물을 폐품처럼 만든다. 어린 민들레꽃의 목에 상처라도 날까 봐 염려하면서 신문지를 구깃구깃 구긴다. 건네준 뒤에는 쌈박하게 한 마디만 하고 나간다. 우리가 위로라고 주절주절 건네는 말들이 때로는 얼마나 진부하던가! ‘슬그머니, 쓱, 딱, 뚜벅뚜벅’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인은‘선물’이 삶이 된 모습을 보여준다.
아, 그렇구나
아침 해가
하루 종일 그 큰 하늘을
건너간다.전봇대 그늘이
해를 따라
옴쪽옴쪽 자리를 바꾼다.그 바람에
전봇대 뒤에 앉은 제비꽃이
함뿍, 햇볕을 받는다.아, 그렇구나.
제비꽃을 위해
해는 좀 힘들어도
서쪽까지 먼 하늘을
건너가는구나.
앞에 살펴 본 시들이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면, <아, 그렇구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아침마다‘하루 종일 멀고 큰 하늘’을 건너가는 해의 수고는, 전봇대 뒤에 앉은 제비꽃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와 영 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위해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 더 멀리 가기도 하고, 조금 더 오래 걷기도 한다. 그런데 아침 해의 그 따뜻한 마음도 전봇대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봇대가 해를 따라 자리를 바꾸어야만 제비꽃이 햇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전봇대는 붙박여 있는 존재다. 마음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이, 전봇대 그늘의 실재적인 자리바꿈으로 드러난다.
‘아침 해- 전봇대-전봇대 그늘-제비꽃’의 관계. 삶은 이렇듯 관계들의 배치와 변화로 이루어진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한 없이 넓디넓은 그물(인드라망)로 표현한다. 그물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이음새마다 구슬을 품고 있다.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 준다. 서로 감응을 주고받는다. 하나의 구슬이 켜질 때 온갖 구슬이 켜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나’에만 골몰한다. 내가 타자들과의 무수한 마주침을 통해 변화를 겪는 존재라는 것을 곧잘 잊어버린다. ‘나-되기’란 실은 ‘남-되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아니 우리가 의식적으로 ‘남-되기’를 시도하기 전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남’들이 들어와 있다. 우리의 머언 조상, 그들과 같이 살았던, 바람과 공기, 그들이 먹었던 동∙ 식물의 유전자……. 우리들이 점점 그것들을 잊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되기’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복원시키는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로렌 아이슬리라는 고고학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진정한 사본(寫本)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시를 쓰는 일은 어쩌면 자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 봉인되어 있던 어떤 생(生)을, 세상 밖으로 꺼내 놓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거룩한 것인지도.
시를 읽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사는 것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
– 달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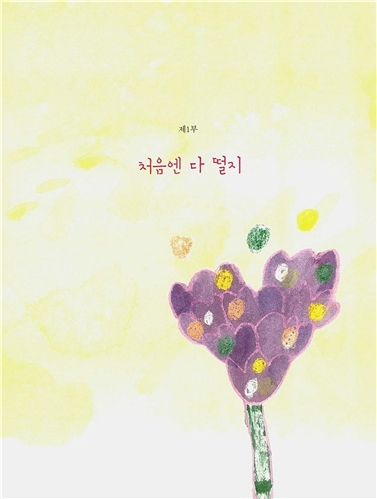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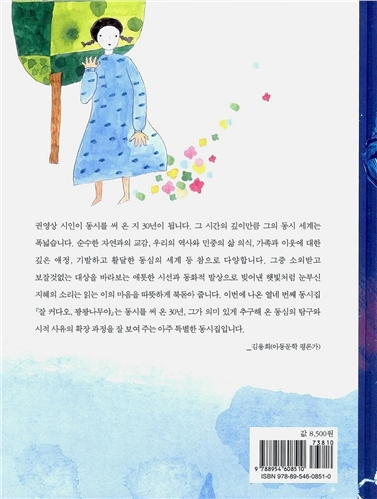

시도 시이지만 시를 읽고 펼쳐낸 사유에 더 마음이 뺐겨 글쓴이가 누굴까
궁금해지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선물의 의미와 내가 남되기,남이 들어와서 나되기를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네요.감사,감사
연초록님.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제 ‘사유’란 건 사실 별로 없고요. 수유 들락거리면서 얻어들은 거랍니다.
맘이 딱…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고걸 쏙 골라서 이렇게 똘똘하게 펼쳐주시다뇨.. 고맙습니다. 덕분에 푹 담겨봐요.
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보니 더 좋네. 권영상 샘 장난스러운 표정이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닌 척하고 눙치는 거. 연주 샘, 고마워!
아, 그렇구나! 하고 가요. ^^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효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