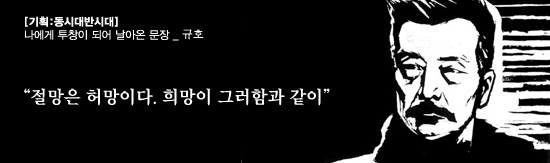
4년 전쯤, 과방에서 후배 한 명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후배가 넌지시 나에게 물었다. ‘형, 심청이는 왜 인당수에 몸을 던졌을까요?’ 그때 나는 ‘심청이? 왜 공양미 삼백 석 가지고 지아비 눈 뜨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무래도 자기가 살기 싫으니까 뛰어 내렸던 거 같은데.’ 라고 나의 대답에 대꾸했다. 당시 나는 맞장구를 치며 ‘나도 그런 것 같긴 해’하고 씁쓸하게 웃었다. 4년 전 이렇게 후배와 나의 기억 속에 인생 비관론자로 남겨 두었던 심청이가 루쉰의 잡감들을 읽으며 다시 깨어났다. 루쉰의 잡감 가운데
<희망>중 이런 구절이 있다.
“절망은 허망이다. 희망이 그러함과 같이”
우리는 살다보면 때론 자신이 생각했던 희망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만 같았던 대학이 그러하고, 소위 번듯한 직장이 그러하다. 또한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신의 삶의 희망으로 여기고 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은 실제 이러한 희망의 대상들과 실제로 마주했을 때 혹은 자식들이 장성했을 때 머지않아 이것들이 얼마나 자신의 꿈과는 먼 다른 무엇임을 깨닫게 된다. 곧 희망의 허망함과 대면한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이 희망의 허망함을 현실의 삶 그 자체라 받아들이고 그 허망함 속에서 허망함을 망각시키는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들의 귀에 몇몇 다른 경우들이 들려오기도 한다.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 석으로 아버지의 눈이 뜨일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절망적 상황에 대한 변환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 보다 많은 상처를 갖게 될지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단일한 앎을 강요하는 대학을 거부하며 자퇴를 선언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예슬양의 이야기가 그와 같다.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절망을 절망함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울림이 두 이야기들 안에 들어있다.
‘인생 참 허망해.’ 이런 말은 누구나가 쉽게 한다.
이에 루쉰은 말한다.
“절망 역시 허망이다. 희망이 그러함과 같이”
루쉰의 이 말은 나에게로 와서 이러한 말로 남겨진다.
“더 이상 희망이란 이름에 매달리지 말자. 그렇다고 희망을 비웃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지도 말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보자” 라고.

왜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졌을까란 질문이 마음에 드는군요.
그렇게 뒤집어 생각해보는 것,왜?
수유공간너머에서 만난 사람들덕분에 저도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많이 품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대학생인 딸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해서 살아가더라도 이런 공간과 만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낯선 공간에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때 규호씨가 따뜻하게 맞이하고,도와주고
그런 마음씀덕분에 쉽게 적응하게 된 것,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hereafter란 제목의 글렌 굴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중인데,here and now
hereafter 두 가지 말의 울림을 가만히 소리내서 이야기해보게 되네요.
음악으로도,언어로도 삶의 공동체로도 서로 조금씩 더 내놓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멋집니다. 루쉰도, 규호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