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나라가 다시 살고 다시
어두워지는 까닭은
나 때문이다. 아직도 내 속에 머물고 있는
광주여, 성급한 목소리로 너무 말해서
바짝 말라 찌들어지고
몇 달 만에 와보면 볼에 살이 찐,
부었는지 아름다워졌는지 혹은 깊이 병들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고향, 만나면 쩔쩔매는
고향, 겁에 질린 마음을 가지고도
뒤돌아 큰 소리로 외치는 노예, 넘치는 오기
한 사람이, 구름 하나가 나를 불러
왼종일 기차를 타고 내려오게 하는 곳
기대와 무너짐, 용기와 패배,
잠, 무서운 잠만 살아 있는 곳, 오 광주여
– 이성부 시집, <우리들의 양식> 민음사
“나는 광주가 참 좋아요.” 두해전 5월이었다. 광주역 앞. 기차를 기다리던 나는 가슴팍으로 짱짱하게 파고 드는 남도의 햇살을 쬐이면서 중얼거렸다. “만약에 서울을 떠나면 광주에서 살고 싶어요.” “왜요?” 옆에서 물었다. “따뜻하니까, 뜨거우니까, 맛있으니까” 내게 광주는 온통 뜨겁고 따스하고 맛깔스런 기억 뿐이다. 열아홉 어느 날, 명동성당 앞에서 삭발한 모습으로 거리선전전을 펼치던 조대생 언니를 보았다. 이철규 열사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얀 종이에 새파란 피가 떨어진 것처럼 전율했다. 무심한 듯 지나가는 명동의 행인들과 나는 분리됐다. 그날로 한겨레신문에 독자투고를 했다. 조선대 이철규 열사 사건에 대해 사람들에게 관심을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신문에 글이 나왔다. 첫 활자데뷔작으로 원고료 8700원을 받았다.
그 조대생 언니의 절규가 날 광주로 이끌었다. 친구들과 함께 왼종일 기차타고 찾아갔던 광주. 망월동 묘역. 천지사방 무덤의 고요. 잠, 잠만 가득한 그 곳. 눈이 맵던 피냄새. 스산하게 흐르던 이산하에와 타는 목마름으로. 꽃잎처럼 스러져간 얼굴 얼굴들. 영정사진들. ‘네가 떠난지 몇 년이 흘렀지만 세상은 그대로구나..’ 까까머리 파릇한 학생의 무덤 앞에 누군가가 써놓고 간 글을 보는 순간 울컥 치밀었다. 세상이 그대로인게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그 때부터 내게 세상은 바뀌어야했다. 땅에서 두발을 타고 어떤 기운이 흘러들어 온몸으로 차츰차츰 들어차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도 광주의 한 사람이 구름 하나가 날 자꾸 부른다. 그러고 보니 남편과도 연애시절 망월동을 두 번이나 갔다. 거기서 우린 다정했다. 만나면 쩔쩔매는 내 청춘의 고향. 내내 내 속에 머물고 있는 빛고을.
피의 부름이려나. 엄마의 고향이 담양이고 아빠는 서울이지만 광주편이었다. 해태타이거즈를 응원했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지했다. 투표하면 기호2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엄마는 참 좋아하셨다. 기어코 해내셨다고. 사람이 저렇게 끈기가 있어야한다고 하셨다. 지역감정이 문중타령 만큼이나 불편했던 풋내나는 기억. 이십대와 삼십대를 보내면서 참 많은 이들과 만나고 헤어졌지만, 지금 내가 사랑의 작대기를 대고 있는 정신적 반려자는 광주를 비롯해 남도 언저리 태생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다. 나의 베푸는 화순태생이다. 기질과 파장이 맞는가 보다. 그들을 통해 광주에 가지 않아도 광주에 산다.
작년에 김대중대통령을 추모하는 광주시민들 모습이 유독 슬펐다. 언젠가 마주쳤던, 백미러로 보았던 택시기사 아저씨 눈. 긴 호수 빼서 물 대주던 식당 아줌마의 눈이 온통 눈물범벅이다. 알 것같다. 국민에겐 ‘노벨평화상’ 수상한 시대의 큰별이었을지언정, 그들에겐 이장님만큼이나 가깝고 무등산만큼이나 크고 든든한 백이었을 테니까. 빛고을이 다시 살고 다시 어두워졌다. 그 때문에.. 5월 18일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민언련에서 문자가 온다. ‘망월동순례 참가신청 하세요’ 좋았다. 아직도 나에게 광주를 가자는 이가 있어서.
– 은유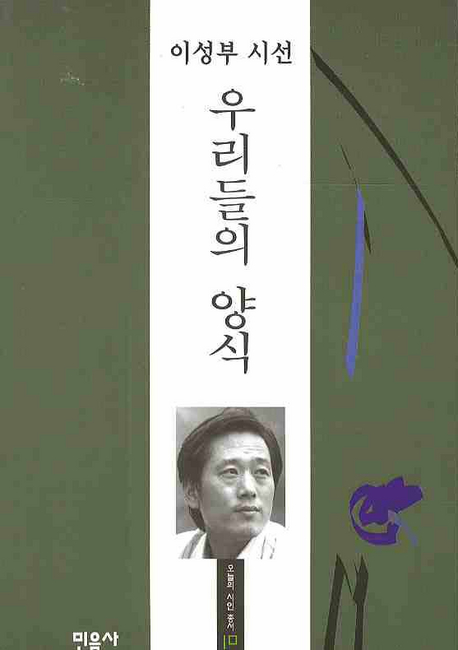

망월동 순례… 생각지도 못한 목표를 주셔서 감사해요 빛고을과 천안함의 아까운 생들을 경험한 나라가 맞는지.. 참 힘든 봄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