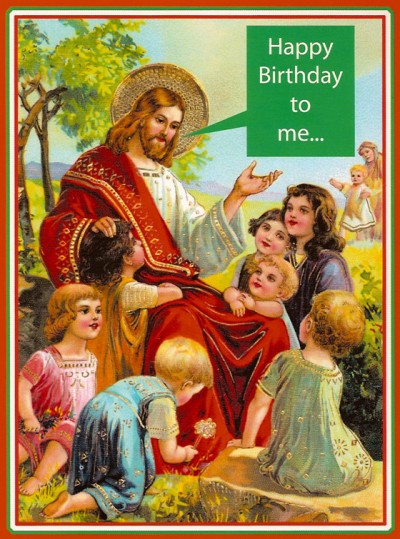작년 12월 공부방에 갔더니 팥죽을 끓여서 간식으로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동짓날이라고 팥죽을 끓였던 것이다. 보통 철마다 먹는 음식이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인 반면 동지팥죽은 종교적 의미가 강하다. 팥죽의 붉은색이 악귀를 내쫓는단다. 그러고 보면 동지는 그렇게 좋은 절기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부정한 것을 내쫓고 없애 버려야 하는 절기이니.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사실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알다시피 동지는 일 년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밤이 가장 긴 날, 어둠의 힘이 가장 센 날이라는 뜻이다.
일 년 중 가장 화려한 절기인 크리스마스가 동지 뒤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고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태양신의 축제일이 예수의 생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하필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축제일이 되었을까. 그것은 동짓날, 그러니까 12월 23일(혹은 22일) 태양신이 어둠의 힘에 패배한 뒤 다시 힘을 되찾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의 힘에 굴복한 태양신은 사흘 뒤(25일) 다시 부활한다. 어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의 이미지가 여기에 덧씌워질 만하지 않겠는가.
고대 로마인들은 동짓날과 크리스마스에서 태양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다. 그렇다면 성리학자들은 이 동짓날을 어떻게 보았을까. 일단 «근사록»에 실려 있는 이 동짓날에 대한 문장을 살펴보자.
하나의 양효가 다시 아래에서 생기니, 이것이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다. 옛날 선비들은 모두 고요함을 가지고 천지의 마음을 보려 하였다. 모두 움직임의 단서가 천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깨닫겠는가.
一陽復於下 乃天地生物之心也
先儒皆以靜爲見天地之心
蓋皆不知動之端乃天地之心也
非知道者 孰能識之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를 이해하려면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주역»의 복괘復卦를 설명한 구절이다. 도대체 복괘와 동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일단 복괘의 모양을 보자. 주역의 괘卦는 모두 6개의 효爻로 이루어져 있다. 긴 막대는 양효陽爻, 그러니까 양의 힘을 나타낸다. 짧은 막대 둘은 음효陰爻, 음의 기운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복괘는 맨 아래 양이 있고 그 위엔 음이 있는 형상이다.
 «주역»이 만들어진 이래로 «주역»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 가운데 일 년 12달의 흐름을 «주역»의 괘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2개의 괘를 뽑아 1년 동안 음양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중에 복괘는 음력 11월, 동지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하다. 동지는 밤, 즉 어둠이 가장 긴 절기이니 모두 음으로 이루어진 곤괘坤卦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12괘를 뽑아 음양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 사람은 복괘, 동지야말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근사록»에서는 여기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보라고 말한다.
«주역»이 만들어진 이래로 «주역»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 가운데 일 년 12달의 흐름을 «주역»의 괘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2개의 괘를 뽑아 1년 동안 음양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중에 복괘는 음력 11월, 동지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하다. 동지는 밤, 즉 어둠이 가장 긴 절기이니 모두 음으로 이루어진 곤괘坤卦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12괘를 뽑아 음양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 사람은 복괘, 동지야말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근사록»에서는 여기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보라고 말한다.
크리스마스의 제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전, 그러니까 동지에서 크리스마스 사이의 사흘간은 어둠의 지배에 놓인 기간이다. 짧게나마 죽음이 지배하는 시간이 있는 셈이다. «근사록»과 «주역»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단절없는 순환. 생명은 언제나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지만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다. 여기서 죽음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은 움직이고(動) 있을 뿐이다. 생명의 끝없는 운동!
박괘剝卦에는 여러 양陽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상구上九 한 효만 남아 있다. 마치 나무 끝에 열매만 따먹히지 않고 남아 있어 장차 다시 생성될 이치가 있는 것과 같다. 상구도 변하면 순수한 음의 괘가 된다. 그러나 양이 다 없어지는 이치는 없다. 위에서 양이 변하여 음이 되면 아래에서 양이 다시 생겨나니 잠시라도 쉼이 없다. 성인께서는 이 이치를 드러내어 양과 군자의 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셨다.
剝之爲卦 諸陽消剝已盡 獨有上九一爻尙存 如碩大之果不見食 將有復生之理 上九亦變則純陰矣 然陽無可盡之理 變於上則生於下 無間可容息也 聖人發明此理 以見陽與君子之道不可亡也
어떤 이가 ‘박괘의 양이 다하면 순수한 음의 괘, 곤괘가 되니 어찌 다시 양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괘를 달에 배치하면 곤괘는 시월이 된다. 기운이 사라지는 것으로 말하면 양이 사라져 곤괘가 되고 양이 다시 오면 복괘가 되니 양은 사라진 적이 없다. 양이 박괘의 위에서 사라지면 복괘의 아래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시월을 일러 양월陽月이라 하였다. 양이 없다고 할까 걱정해서이다. 음陰 또한 그러하나 성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다.
或曰 剝盡則爲純坤 豈復有陽乎 曰 以卦配月 則坤當十月 以氣消息言 則陽剝爲坤 陽來爲復 陽未嘗盡也 剝盡於上則復生於下矣 故十月謂之陽月 恐疑其無陽也 陰亦然 聖人不言耳
박괘剝卦는 복괘를 뒤집어놓은 형상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래의 다섯 효는 모두 음이고 맨 위에 있는 효가 양이란 말이다. 인용한 «근사록» 구절에서 상구上九는 맨 꼭대기에 있는 양효를 가리킨다. 효는 아래에서 위로 세는데 맨 위에 있는 효는 상上이라 부른다. 여기에 음과 양을 대표하는 숫자로 6과 9를 넣어 효를 부르는 말로 삼았다. 그러니까 복괘의 가장 아래에 있던 효는 일구一九라고 읽는다. 박괘의 효를 아래부터 읽으면 ‘일육一六, 이육二六, 삼육三六, 사육四六, 오육五六, 상구上九’가 된다.
아래에서 위로 읽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음양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박괘는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상구, 양효가 없어질 형국에 처한 것이다. 이 양효가 사라지고 아래에 음효가 들어오면 순전히 음으로 이루어진 곤괘가 된다. 여기서 문제는 이 곤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이 사라지고 음만 가득 찬 시간이 아닌가. 그러나 «근사록»의 기록자는 이 곤괘 다음에 양을 회복하는(그래서 이름이 復이다!) 복괘가 오기에 양의 흐름이 끊어진 적이 없다고 말한다.
현상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들은 음과 양의 흐름을 단절 없는 연속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곤괘가 대표하는 음력 10월을 양월陽月이라 불렀다. 음으로 만 이루어진 달을 양의 달로 부르는 역설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음양엔 단절이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모두 양으로 되어 있는, 건괘乾卦가 대표하는 음력 4월도 마찬가지이다. 드러난 모양으로는 양만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음이 숨어 있다. 12달을 대표하는 이 12벽괘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음과 양의 끊임없는 순환이다. 양에서 음을, 음에서 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大壮
동지
冬至
대한
大寒
우수
雨水
춘분
春分
곡우
穀雨
소만
小満
하지
夏至
대서
大暑
처서
處暑
추분
秋分
상강
霜降
소설
小雪
어떤가? 음양의 움직임이 보이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양陽과 군자의 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리학자들이 세계의 종말을 사유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이 보기에 이 우주의 본질은 생명의 운동이다. 이 끝없는 생명 순환에서 우주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난다. ‘악惡’은 따로 있지 않다. 이 순환의 흐름을 막고 해치는 것이야 말로 ‘악’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남산에 올랐다. 따뜻한 햇볕이 걷기에 참 좋았다. 겨울 내 얼었던 땅도 녹아 있었다. 다음날엔 오랜만에 비가 내렸다. 알아보니 지난 19일이 우수雨水였다. 눈이 비가 되는 절기란다. 절기에 맞춰 어김없이 세상은 변하고 있다. 곧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다. 이제 만물이 생장하는 봄이다. «근사록»에서 말하는 생명의 운동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계절인 셈이다. 어떤가, 봄을 맞아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는 것이. 자연은 올해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