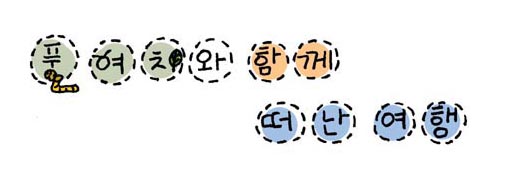
카페 안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게다가 성한 것이라곤 채송화 씨앗만큼도 없었다. 문짝이 떨어져나간 냉장고, 찌그러진 톱밥난로, 낡은 공중전화 부스, 건반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간 오르간, 구멍 뚫린 나무보트, 오래된 타자기, 찢어진 우산, 부서진 기타 같은 것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칠이 다 벗겨진 책장 위에는 녹슨 열쇠꾸러미가 걸려 있고 그 아래 선반에는 수동 라디오와 망가진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물에 젖어 나무때기처럼 딴딴해져 있거나 표지가 찢겨져 나갔거나 중간 중간 페이지가 떨어져나간 것들이었다. 창가에는 빵꾸난 운동화들이 놓여 있고 그 아래에는 한쪽 손잡이가 부러진 목마가 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는데 제각각 가리키는 시간이 달랐다. 어떤 것은 오후 4시. 어떤 것은 저녁 11시, 어떤 것은 새벽 4시… 어떤 것은 느리게 가고 어떤 것은 천천히 가고, 시간이 멈춰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계도 있었다. 벽에 붙은 달력들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것은 2년 전 가을, 어떤 것은 5년 전 겨울, 어떤 것은 10년 전 여름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고물들 사이사이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들도 대체 어디서 주워 왔는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폐교에서 주워온 것 같은 나무의자와 회장님이 앉을 법한 검은색 팔걸이 의자, 슈퍼에 있는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 등 도통 어울리지 않는 의자들이 한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테이블도 다리가 부러진 것들 투성이여서 책을 층층이 쌓아 다리 대신 받쳐 놓았다.

그래도 이곳을 카페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향기 덕분일 것이다. 카페에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마치 새벽에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꽃잎을 아주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끓이고 있는 것 같은 향기였다. 문을 열자마자 슬슬 풍겨오는 그 향기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가 카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카페 곳곳을 둘러보다가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발견해냈다. 내가 ‘발견해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이 고물들과 너무나 잘 어울려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잊혀진 옛 시절의 옷을 전시해 둔 박물관의 모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많은 고물들은 대체 어디서 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나의 물음에 히피 할머니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어디에 고물들이 있다는 거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고물들이 내 눈에만 보인다는 걸까. 나는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기에 앉으렴. 차를 끓여갖고 오마.”
나무 테이블 위에는 덮개가 떨어져나간 필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몽당연필과 크레용이 들어 있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내 크레용으로 낙서를 했다. ‘고물들만 있는 이상하고 후진 카페. 그치만 재미있다. ㅋㅋ’
그렇게 돌멩이와 애벌레 같은 낙서를 하고 있는데 히피 할머니가 차를 갖고 왔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맛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굳이 표현한다면 달큰하면서도 칼칼한 맛이랄까.
“이건 무슨 차에요?”
“짜이라고 한단다. 어떠냐. 맛이 괜찮지?”
맛 좋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고 있으려니 낡고 해지고 먼지가 세월을 타고 내려앉은 이 고물딱지 공간이 꽤 근사하게 느껴졌다. 몸이 나른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왔다. 의자에 몸을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와 화들짝 잠에서 깼다.
“엄마! 오토바이 탔지? 또!”
웬 남자가 카페 문을 열자마자 히피 할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며 말했다.
“안 탔어! 타긴 누가 탔다고 그래애.”
“거짓말. 흙이 묻었던데. 바퀴에.”
“그래. 탔다. 다리가 아파서 탔다. 됐냐?”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안 썼지? 헬멧, 또!”
“그거 쓰면 폼이 안 난다구엉!”
“으이구. 내가 못 살아. 그럼 안돼. 써야 돼. 꼭!.”
나는 히피 할머니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놀랍게도 그는 외국인이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은 왕방울만. 길에서 외국인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다. 내가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는지 그도 히피 할머니와 얘기를 하다말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이 어찌나 큰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도 모르게 목이 움츠러들었다.
“인사해라. 이제부터 우리 카페에서 함께 일하게 될 아이란다.”
‘오잉? 함께 일하게 될 아이라고?’ 나는 할머니를 향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할머니는 눈을 찡긋거리며 그와 나를 의자에 앉혔다.
“안녕하세요. 나는 얄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그가 갑자기 정중한 태도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손을 맞잡았다.
“아, 안녕하세요. 전 모모라고 합니다.”
“당신이 모모라구요?”
내가 이름을 이야기하자 그는 입을 커다랗게 벌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얗고 가지런한 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눈동자가 아이처럼 반짝였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만이 아니었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보며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닌가.
“우린 아까부터 모모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지. 우린 모모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
그리고 순간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아까부터 구석에 앉아 있던 사람만큼 커다란 곰인형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만나게 돼서 반가워. 모모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나는 기가 막혔다. 대체 여기는 어딜까. 그리고 이들은 누구길래 여지껏 날 기다려왔다는 걸까. 마치 토끼를 따라 이상한 세계에 들어온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다. (4화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