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암흑 속에 등대지기처럼 홀로 있는 김진숙씨를 만나러간 희망버스가 경찰의 차벽에 막혀 버렸습니다. 솔직히, 좀, 허망합니다. 지난 번 때는 700명으로도 벽을 넘고 용역깡패를 몰아내고 85호 크레인에 올랐는데,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문화제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철조망을 치고 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뿌리고 곤봉을 휘둘러서 어쩔 수 없었다지만, 충분히 그럴 거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건 그 예상이 차벽 앞에서 항의하고 문화제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귀결되었다는 겁니다. 2008년 촛불의 양상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수백, 수천의 촛불이 들불 같은 속도로 청와대 앞까지 진격했다가 점차 수만, 수십만의 화려한 조명등으로 전락하여 차벽 앞의 무대만 밝히다가 스러진 기억이 아프게 되살아납니다. 차벽이 무서운 건 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멈춰서 그 너머를 갈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희망임을 망각하고 차벽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 듯이. 차벽 넘을 궁리만 하고 차벽만 바라보다 끝내 넘지 못하는 자신과 현실을 한탄하게 만드는 까닭입니다. 그럴 때 희망은 허망합니다. 그 때 희망은 고문입니다. 차라리 차벽 너머의 희망을 잊고 스스로 희망(希望: 희미한 불빛)이 될 때까지 암흑 속을 달리는 게 낫습니다. 절망이 허망해질 때까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희미한 등불이 되고 있는 김진숙씨와 희망의 허망함을 싣고 돌아온 희망버스 탑승자들께 꼭 루신의 ‘희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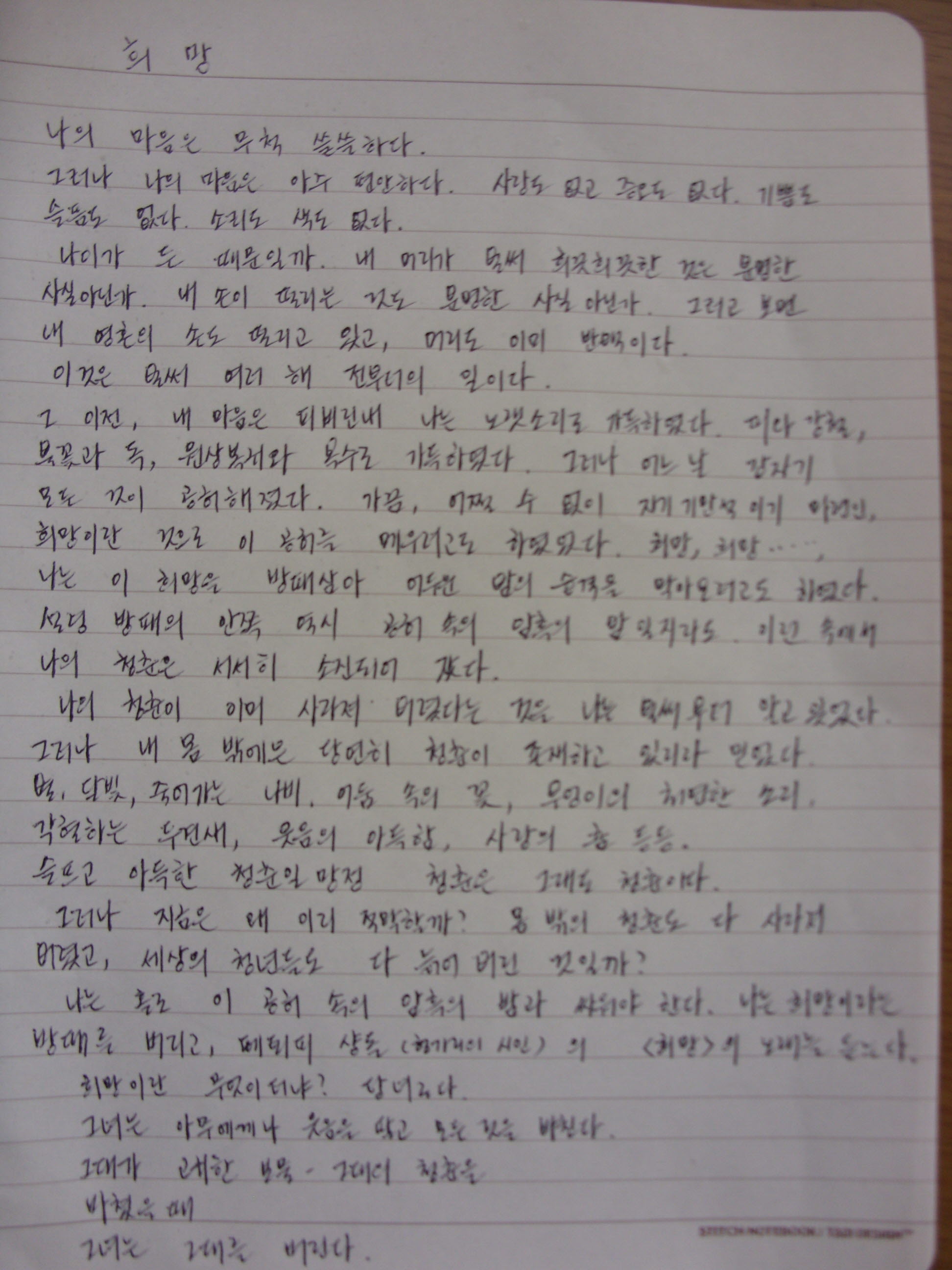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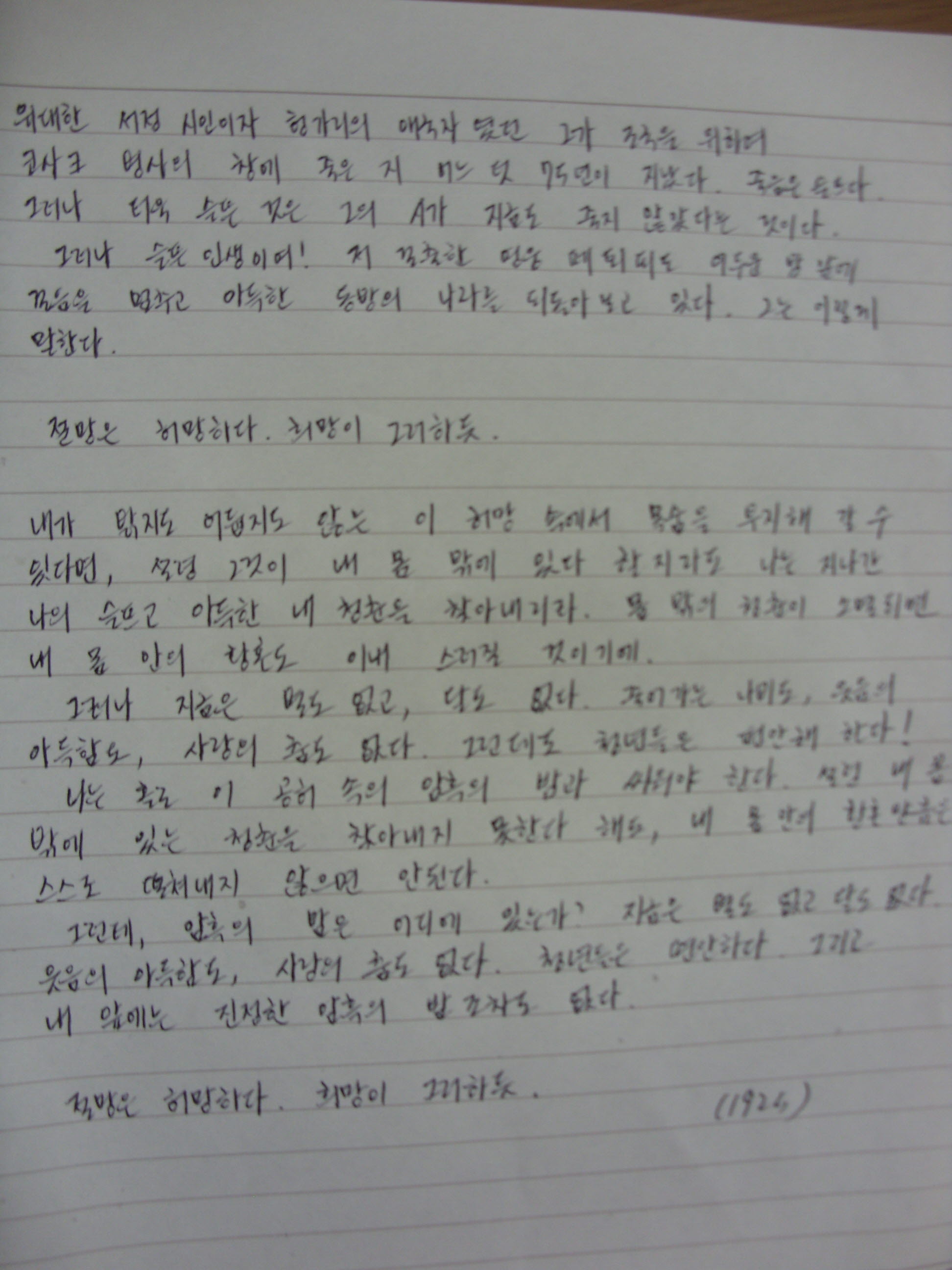
희망
나의 마음은 무척 쓸쓸하다.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주 편안하다. 사랑도 없고 증오도 없다. 기쁨도 슬픔도 없다. 소리도 색도 없다.
나이가 든 때문일까. 내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내 손이 떨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닌가. 그러고 보면 내 영혼의 손도 떨리고 있고, 머리도 이미 반백이다.
이것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의 일이다.
그 이전, 내 마음은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하였다. 피와 강철, 불꽃과 독, 원상복귀와 복수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해졌다. 가끔, 어쩔 수 없이 자기 기만적이기 마련인, 희망이란 것으로 이 공허를 메우려고도 하였었다. 희망, 희망…, 나는 이 희망을 방패삼아 어두운 밤의 습격을 막아보려고도 하였다. 설령 방패의 안쪽 역시 공허 속의 암흑일지라도. 이런 속에서 나의 청춘은 서서히 소진되어 갔다.
나의 청춘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 몸 밖에는 당연히 청춘이 존재하고 있으리라 믿었다. 별, 달빛, 죽어가는 나비, 어둠 속의 꽃, 부엉이의 처연한 소리, 각혈하는 두견새, 웃음의 아득함, 사랑의 춤 등등. 슬프고 아득한 청춘일망정 청춘은 그래도 청춘이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리 적막할까? 몸 밖의 청춘도 다 사라져 버렸고, 세상의 청년들도 다 늙어 버린 것일까?
나는 홀로 이 공허 속의 암흑의 밤과 사워야 한다. 나는 희망이라는 방패를 버리고, 페퇴피 샹돌의 <희망>의 노래를 듣는다.희망이란 무엇이더냐? 탕녀로다
그녀는 아무에게나 웃음을 팔고 모든 것을 바치게 한다.
그대가 고귀한 보물 – 그대의 청춘을
바쳤을 때
그녀는 그대를 버린다.위대한 서정시인이자 헝가리의 애국자였던 그가 조국을 위하여 코사크 병사의 창에 죽은 지 어느덧 75년이 지났다. 죽음은 슬프다. 그러나 더욱 슬픈 것은 그의 시가 지금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슬픈 인생이여! 저 걸출한 영웅 페퇴피도 어두운 밤 앞에 걸음을 멈추고 아득한 동방의 나라를 되돌아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절망은 허망하다. 희망이 그러하듯.
내가 밝지도 어둡지도 않는 이 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 갈 수 있다면, 설령 그것이 내 몸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나간 나의 슬프고 아득한 내 청춘을 찾아내리라. 몸 밖의 청춘이 소멸되면 내 몸 안의 황혼도 이내 스러질 것이기에.
그러나 지금은 별도 없고, 달도 없다. 죽어가는 나비도, 웃음의 아득함도, 사랑의 춤도 없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편안해 한다!
나는 홀로 이 공허 속의 암흑의 밤과 싸워야 한다. 설령 내 몸 밖에 있는 청춘을 찾아내지 못한다 해도, 내 몸 안의 황혼만큼은 스스로 떨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암흑의 밤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별도 없고 달도 없다. 웃음의 아득함도, 사랑의 춤도 없다. 청년들은 편안하다. 그리고 내 앞에는 진정한 암흑의 밤조차도 없다.
절망은 허망하다. 희망이 그러하듯.
(1925)

동의하기 어려운 평가군요.
차벽을 넘을까 말까를 고민하던 촛불시위와는 달랐지요.
적절한 전술적 출구를 못찾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투석전이라도 벌이는 게, 가능했던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 효과란 면에서 적절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실패’로 끝난 만남이 민주당 정치인들마저
부산으로 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부산이 정치의 성지가 되고 있다면서 근심하고 있는 기사를 썼던데…
물론 3차에선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방안이 있어야 희망이 될 겁니다.
허나 2차 희망의 버스 ‘출장시위’에 대한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