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니 미술관에 다녀와도 좋겠다. 무엇보다 여름 피서지로는 미술관만한 곳이 없다. 입에서 김이 날 정도로 강력한 에어콘이 나오는 데다가, 방학 때는 요런조런 유명작들도 볼 수 있으니, 아이들이 몰리는 낮 시간을 적당히 피한다면 알차게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다녀온 곳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지금 그 곳에서는 프랑스의 현대미술들을 볼 수 있는 기획전 《오늘의 프랑스 미술- 뒤샹 프라이즈》전이 열리고 있다. 현재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 상은 영국의 ‘터너 프라이즈’인데, 프랑스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살아있는 동안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마르셀 뒤샹을 모셔다가 ‘프랑스’의 수상제도를 만들었다. 예술이 무슨 올림픽도 아닌데, 국가니 수상이니 하는게 썩 내키지는 않으나,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와 큰 상관없는 우리로서는 전시된 작품들을 기꺼이 즐겨주면 될 것이다. 20세기 이후 전개된 대부분의 현대미술은 여전히 뒤샹의 주제곡들에 더해지는 변주곡들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보통 ‘예술가’를 떠올리면 반 고흐처럼 지극히 천재적이며 광적인, 하여 삶의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살로 마감되는 인물들을 떠올리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뒤샹은 매우 운이 좋은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돈이 많은 공증인인데다가 교양을 갖추었으며, ‘심지어는’ 세 예술가 아들들의 재정을 거의 평생 지원해 주었다.(게다가 아들들이 타 쓴 용돈을 꼼꼼히 계산해 두었다가 이후 물려줄 유산에서 공제하기까지 했던 지극히 합리적인 면도 갖추었다.^^) 뒤샹 자신 또한 ‘여자, 아이들, 별장, 자동차’와 같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는 법과, ‘결혼이란 매우 귀찮은 일’이라는 것을 다행히도 매우 일찌감치 깨달았다. 그에게는 ‘크나큰 불행이나 슬픔, 신경쇠약 같은 것’이 없었고, 예술을 통해 ‘무언가 분출해야만 한다는 강박증’도 없었다. 예술보다 ‘살며 숨쉬는 일을 더 사랑’했으며, ‘체스’에 더 열광했다. 평생 많은 책을 읽지도 않았으며, 대개는 자신의 전시회에 가보지 않을 만큼 무심했다. 그의 말을 빌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자주 볼 수 없었고, 만약 보게 된다면 ‘골치아픈 영화’는 보지 않았다. 예술이란건 일상적 삶보다 특별한 무언가일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 자신의 말을 빌면 ‘산다는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 화가라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오늘의 프랑스 미술- 뒤샹 프라이즈》전 작품들 가운데 시프리앙 가이야르(Cyprien Gaillard)의 1분 남짓한 영상 작품은 뒤샹의 유머를 떠올리게 했다. 처음에 화면 중앙에 거대하게 피흘리며 노려보는 남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는 심각한 혁명이나 사회운동을 생각했다. 준비된 의자에 앉아 처음부터 차근히 영상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낄낄거렸다. 스토리는 이렇다. 고급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 한 가운데 눈부시게 빛을 반사하면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호수가 있다. 낭만적 풍경을 이루는 이 멋진 호숫가에 두 명의 남자가 수영을 즐기기 위해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든다. 멋진 로맨스 영화가 따로 없다. 그런데 아뿔싸! 뛰어들고 보니 그 호수는 무릎 밖에 오지 않는 얕은 물이었고, 순간 머쓱해진 두 남자는 물 밖으로 나와 얼굴과 무릎에 흐르는 피를 닦는다.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피 흘리는 주인공의 ‘얼굴’이다. 그냥 웃고 끝날 수도 있는 이 해프닝의 결말에서 그는 전혀 웃지 않고 차라리 정색하며 카메라를 바라본다. 동시에 관객들은 클로즈업된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2011년 8월 오후, 나는 문득 ‘얼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뒤샹은 종종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매우 세련되고 유행에 민감한 모습으로 만 레이의 사진에 등장한다. 그녀의 이름은 ‘(에)로즈 셀라비’. 뒤샹의 또 다른 분신이다. 뒤샹의 여성적 분신은 1920년 출현했는데, 정체성을 바꾸고 싶었던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이름을 바꿀까 고민했었다. 피에르 카반과의 대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종교를 바꾸어 볼까 하다가 문득 성별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게 훨씬 간편해 보였죠.’ 그가 처음 고안한 로즈 셀라비Rose Sélavy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언어 유희였는데, 그것은 프랑스어로 ‘(E)Rose C’est la Vie'(성, 이것이 삶이다)와 동음이의어다. 에로즈 셀라비는 1939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초현실주의전Exposition Internationale du Surréalisme》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서 뒤샹은 하체를 벗기고 상체에는 자신의 양복을 입힌 여자 마네킹을 전시했다. 상의에는 남성의 양복을 걸치고 하의는 관능적인 여성성을 드러내는 그녀를 보자니 모호한 성적 정체성이 매우 기이하게 느껴진다.
뒤샹에게는 괴물 분신도 있다. 뒤샹이 머리에 비누거품을 묻혀 사티로스의 뿔을 흉내내며 만 레이의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한 것이다. 그는 머리에 마구 비누거품을 묻히며 노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뉴욕에 망명중인 초현실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한 《초현실주의 첫 보고서전First Papers of Surrealism》(1942)에서 뒤샹은 이 전시의 카탈로그에 작가 얼굴을 올리지 말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평범한 얼굴로 ‘보완적 초상(compensation portraits)’을 선택해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자신은 1930년대 미국의 사진작가인 벤샨(Ben Shan)의 작품에 등장하는 야윈 모습의 여인 초상을 선택했다. 뒤샹이 선택한 초상은 1935년 벤 샨이 농업안전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난한 농촌 여인을 찍은 사진인데, 뒤샹과 묘하게 닮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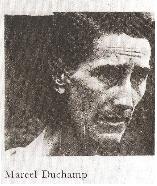


얼굴이란 무엇인가. 현대미술에서 인간의 얼굴에 대한 파괴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1907-08)에서 그 전조를 보였다. ‘얼굴의 해체는 곧 ‘인간성’이라고 하는 오래된 신화에 대한 현대예술이 반격이며 코기토의 확고한 믿음에 대한 불신이다. “넌 누구니?” 쐐기 벌레의 물음에 앨리스는 무척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때 이후로 여러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동등한 닉네임’이다(이민하). ‘우리는 이곳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이름들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투명테이프처럼. 안녕. 안녕. 금방 버려진 이름들과 함께 하였던 우리의 유머와 블랙. 사랑과 블랙. 우리들은 사랑스럽고 드디어 모호해진다(김행숙).
위의 얼굴들 중 그 어떤 것이 ‘진정’ 뒤샹의 얼굴인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불어 어떤 사진이 뒤샹이 ‘분한’ 모습인지 묻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애초에 어떤 실체가 있어 분신과 변신이 있겠는가. 분명히 내 몸을 관통하고 지나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무수한 느낌들이 나를 이룬다. 이 느낌들의 쇄도를 긍정하면 자아는 증발해 버리고 만다… 매순간 나는 무수하고 하염없으며 희미하다…. 이상한 나라의 체셔 고양이처럼 투명인간은 원본이 없는 자유이고 중심이 없는 생성이다’(신형철) 순간순간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뮬라크르의 세계에서 여전히 고정된 자아와 세계에 집착하는 자, 환영의 세계에 뛰어들어 상채기 난 얼굴의 피를 닦게 될 것이다.

쌤! 많이많이 보고시퍼용… 얼릉 연구실에서 뵈요^^
흥미진진한 글 와! 와우 ! 하며 정신없이 읽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내 얼굴에 상처가 !!! ㅋㅋㅋ
허나,
은근한 미소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