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하첼을 떠나려던 날 아침, 호텔 주인에게서 마을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작 알려주실 것이지 … 곧장 밖으로 나가 퍼레이드가 진행될 것이라는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행진하는 아이들의 자못 진진한 표정이며 구경꾼들의 들썩이는 분위기며, 사진으로 담고 싶은 장면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던 모습을 카메라 바인더를 통해서 보면 어떤 꺼림칙함이 생겼다. 한 데 어울려 즐기다가도 카메라만 들면 왠지 홀로 그 상황 바깥으로 나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이 느껴지는 그 불편함은 무엇일까. 이번만이 아니다. 여행길에서 풍경을, 특히 사람들의 모습을 찍다보면 저 물음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답은 찾지 못했다.
여행지에서 카메라를 들이미는 행위는 남의 일상에 갑자기 작은 파란을 불러일으킨다. 그 파란은 서로 간에 웃음으로 번질 수도 있고, 상대의 주뼛거림이나 불편한 표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찍고 찍히는 사이에 그렇듯 알게 모르게 의미가 교환될 테지만, 대개 그 의미는 찍는 쪽이 결정하거나 적어도 보존한다. 글로 쓰는 일과 달리 사진은 사진찍는 내 행위를 상대가 눈치 채기 쉽다. 혹은 상대가 모르게 상대를 사진에 담으면 그 사람의 무언가를 몰래 가져온 듯 뒤가 켕기곤 한다. 글쓰기보다 사진 찍기가 대상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존하면서도 품은 그만큼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편함을 더한다.
사진 찍기는 또 한 번 답 없는 물음을 안겼다. 다만 이번에는 사진이 안기는 불편함이 어디서 연원하는지 조금 더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떠오른 것은 사진에는 내가 피사체로 정한 상대방은 담기지만 정작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 자신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물론 사진을 보면 거꾸로 찍은 사람의 위치와 때로는 그 사람의 당시 감상마저도 감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순간 한 공간에 있었다고는 하나 역시 찍는 자와 찍히는 자 사이에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
이를 공재성(coevalness)이란 개념을 가져와 이론적으로 우회해도 될까. 공재성이란 ‘함께 한 자리에 있음’을 뜻한다. 인류학자인 파비언(Johannes Fabian)은 인류학적 지식이 지닌 폭력성을 꼬집고자 이 개념을 고안했다. 즉 인류학은 선주민의 사회와 문화를 지적대상으로 삼는데, 인류학자는 현지 조사에서 통역자와 안내인을 거쳐 선주민과 대화를 나눠야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습득한 재료들이 말끔한 지식의 모습을 갖출 무렵에는 통역과 교류의 흔적은 사라지고 한 시 한 장소에 같이 있었을 인류학자와 선주민은 앎의 주체와 앎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진다. 이를 두고 파비언은 ‘공재성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확실히 파비언이 지적한 사태는 여행에서 남들의 일상을 사진에 담을 때 정말이지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챙겨 오지만 내게는 그 행위에 관해 그들에게 답해야 할 책임이 없다. 이윽고 그 장소를 떠나 돌아오면 나와 그 사람은 감상하는 자와 사진첩 속의 인물로 역할이 확정된다. 이렇듯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나뉜다. 그리하여 자기 삶의 맥락에서 뜯겨져 나온 그 사람의 이미지는 내게는 이국적일수록 나의 지적 허영도 달래주며 사진의 가치도 높여준다.
이것만이 불편함을 안기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대상의 일부만을 절단하고 채취한다는 카메라의 속성도 한 몫을 한다. 카메라는 피사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여백이나 공백으로 처리한다. 그런 까닭에 비평가 수잔 손택(Susan Sontag)은 촬영(shot)에서 저격(shot)의 어감을 읽어내기도 했다. 내 친구도 커다란 렌즈를 두고 남자의 성기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대상을 밀고 당기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확실히 사진 찍기는 선택과 절단과 추출의 연속된 과정이다. 특히 외국여행에서는 자기 필요에 따라 그 사회의 고유한 나머지 의미들은 체로 걸러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만을 남겨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행의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행에서는 돈이 그저 교환수단이 아니라 거기에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의미가 담기듯이, 사진 찍기도 폭력적일 리만은 없다. 바로 사진 찍는 행위는 저 꺼림칙함을 사고의 소재로 안기지 않는가. 카메라의 초점이 외면한 여백은 여백대로, 잘려나간 공백은 공백대로 눈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상상하도록 이끈다. 또한 품이 덜 들기는 하나 사진을 찍으려고 심도를 재고 각도를 정하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일들은 그 하나하나가 대상을 어떤 모습으로 간직하고 싶은지 사고의 절차를 밟도록 만든다. 개중에 어떤 사진은 보고 있자면 왜 저렇게 찍었는지 그때의 감상이 묻어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진을 찍는 일과 보는 일은 해석학적 기쁨을 동반한다. 삶의 한 순간을 포착해 의미를 입히거나 잘려진 삶의 한 단면에서 풍부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일은 삶이 지니고 있을 깊이와 복잡한 결을 이해하는 일종의 훈련이 된다. 사진 찍기도 여행의 일부라면, 여행이 그렇듯 그 가능성은 양쪽으로 열려있을 것이다. 폭력과 애정은 함께 머문다.
– 윤여일 (수유너머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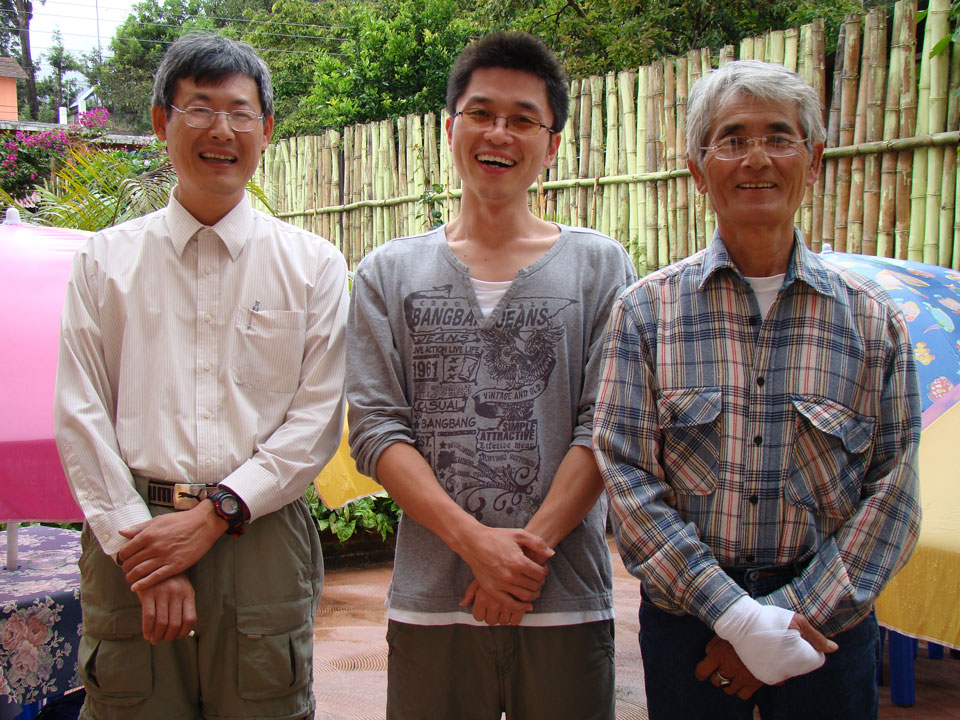

축제 사진 잘 봤고, 사진의 의미에 대한 글도 잘 읽었습니다. 공재성의 상실이라는 개념과 사진을 남근이 비유한 게 흥미있네요. 앞으로도 좋은 사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