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를 공부하는 법? 밑줄 쫘악- 돼지 꼬리 땡땡~
논어에 보면 공자가 아들 공리孔鯉에게 시 공부를 독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벽을 코앞에 두고 선 사람 같다고. 한마디로 콱 막힌 사람이라는 말일테다.
그래, 시를 배워야 좀 뭔가 교양 있는 사람답지 않던가. 하다못해 좋은 경치나 멋진 광경을 보고서도 분위기 있게 이야기할 거리라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얻는 것이 영 형편없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가득 찬 그 괴상한 글을 어떻게 공부한단 말이지? 게다가 이제 시를 읊으며 폼 잡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대화 속에서 시가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생들이 시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언어 영역에 나오는 고작 몇 문제를 위해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은 피땀 흘려 시를 공부한다. 시에 나오는 알 듯 모를 듯한 단어들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긋고 하면서.
시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째로 외우는 거다. 이 시어는 억눌린 민중의 마음을 대표하고, 저 시어는 초월의 의지를 의미하고 등등. 한 수 십 편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안심이 된다. 시간이 좀 남으면 저자별로 시어별로 서로 연관 있는 것끼리 인덱스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수.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시 문제는 항상 뒤통수를 친다.
2. 소리 내어 읽어야 제 맛
벽처럼 콱 막힌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어영역에서 최소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시를 공부했다. 그러니 시가 재미있을 리 있나. 가끔 짠 하는 감동이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세상에서 따분하고 어려운 것이 시 수업이더라. 당연히 대학 입학 이후엔 시를 읽기는커녕 시집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우연한 기회에 청소년들에게 시를 가르치게 되었다. ‘청소년 고전학교’에서 한문 고전과 함께 시를 암송하는 수업을 맡게 된 것이다. 고전을 공부하다 보니 <대학>이나 <논어> 따위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수업에 합류했지만 시에는 문외한. 다행히 밑줄 긋고 돼지꼬리 땡땡 치며 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시를 읽고 암송하는 수업이었다.
암송의 왕도는 하나. 소리 내어 반복해서 읽기. 한 두 번은 물론 안 되고 여러 번, 입에 익도록 읽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소리 내어 읽어보니 시의 다른 멋이 느껴지는 것이다. 마치 씹으면 씹을수록 밥맛이 달라진다는 것처럼 소리 내어 읽을수록 다른 맛을 전해 주었다. 이전에는 그냥 꿀떡 삼켜 버렸던 시가 말이다.
재미있는 건 그렇게 여러 번 읽다보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는 점이다. 그 시가 몇 음보인지,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찬찬히 읽어보면 안다.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썼는지도. 그래서 멋진 시를 발견하면 눈으로 읽어내려 가기 보다는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기로 했다. 좋은 시일수록 거듭해서.
– 시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 생각보다 우렁차니 볼륨 조절에 신경쓰세요~^^(출처: 맹꽁이 책방)
이희승 | 벽공碧空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 하고 금이 갈 듯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개를 여나믄이나 기르되 …개를 여나믄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님 오며는 꼬리를 홰홰치며 치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며는 뒷발을 바둥바둥 무르락 나오락 캉캉 짖는 요 도리 암캐
쉰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줄이 있으랴
송시열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綠水라도 절로 절로
산 절로 절로 수 절로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늙으리라
3. 네 삶을 보여줘!
지금도 청소년들과 매주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우선은 <논어>를 공부하고 나서 시를 함께 공부한다. 최근엔 주로 시조를 공부한다. 보통 세 줄이 되는 짧은 글이다 보니 오랜 시간 좀이 쑤셔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에 아주 적절하다.(안타깝게도 백석의 시, ‘여우난 곬족’과 같은 시는 다 읽기도 전에 대부분이 지쳐버리기 일쑤다. ㅠㅠ)
시를 함께 여러 번 읽고는 이 시를 바탕으로 시를 짓는 시간을 갖는다. 때로는 시에 나왔던 소재를, 때로는 표현을, 가끔은 주제를 빌려서 시를 지어본다. 쉽게 말해서 시조 패러디. 시간은 길지 않다. 한 10분에서 짧을 땐 5분 정도에 써 내도록 독촉한다. 바라는 건 하나. 자기의 이야기를 짧은 시로 표현해보기.
그러다 보니 이른바 똑똑한 친구들이 이 시간엔 영 맥을 못 춘다. 좀 멋있는 말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다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곤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써 놓은 것을 보면 이게 누구 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각이 아직 영글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그래도 있는 그대로 날 것을 표현해 내는 우직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진다. 글에는 자신의 흔적이 남는다고 했던가. 시를 모아놓고 읽다보면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사는지. 고민은 뭔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에 자신의 삶을 뚝뚝 떼어 놓는 것이다. 거침없이.
처음에는 한 줄을 쓰는데 끙끙대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놓는다. 이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줄이고 내용을 자르느라 끙끙댄다. 자, 이 친구들의 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본래 시조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시를 썼을지 짐작해 보시길.
안민영은 몹시도 그리던 사람을 만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을 시로 썼다. 이 시를 읽고는 몹시도 기다렸던 대상을 만나본 경험을 시로 써보라고 했더니 이런 시가 나왔다. 이들에게 알뜰히 그리운 대상은 밥이더라.
안민영
알뜰히 그리다가 만나보니 우습구나
그림같이 마주 앉아 맥맥脈脈이 볼 뿐이라
지금에 상간무어相看無語를 정情일런가 하노라* 맥맥이: 계속해서
* 상간무어: 서로 보면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
한라산 등반 | 심어진
후헥후헥 11시간동안 등반하여
하악하악 도착해 목욕하고 삼겹살을 보니
우걱우걱 여지 없이 2인분을 먹어치웠다.
점심시간 | 정우경아침을 안 먹고 오니 점심 시간이 기다려진다
수업 시간에 공부는 머리에 안 들어오고
오직 밥 생각뿐이라
위 시를 쓴 친구 가운데 심어진이란 친구는 항상 배고픈지 먹는 것을 주제로 시를 짓기로 유명하다. 오죽하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조차 오늘은 어떤 음식으로 시를 지을지 기대하니. 그래도 매번 어진이의 시가 기대되는 것은 진심을 담은 탓에 읽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게 된다는 점이다.
고향을 떠나 청나라로 압송되는 김상헌의 시조 ‘가노라 삼각산아’를 읽고는 간식거리를 빼놓고 캠핑 가는 자신의 처지(?)를 쓰기도 했다. 그 뿐인가. 정훈의 시조 ‘뒷 뫼에 뭉친 구름’을 읽고도 역시나 먹을 궁리뿐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고민을 먹거리에 대한 고민으로 승화(!)시키는 이 대단한 뚝심.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정훈
뒷뫼에 뭉친 구름 앞들에 퍼졌구나
바람 불지 비 올지 눈 올지 서리 올지
우리는 하늘 뜻 모르니 어찌할 줄 모르노라
캠핑 | 심어진
가노라 간식아 다시 보자 라면아
저 멀리 캠핑을 떠나는데
밥을 안 챙겨오니 안달복달 하여라
고기 | 심어진산에서 고기 잡아 부모님과 먹으려니
이놈을 삶아야 할지 구워야 할지 끓여야 할지 쪄야 할지
요리법을 까먹으니 어찌할 줄 모르노라
먹는 것과 더불어 어진이가 좋아하는 것을 들자면 야구가 있다. 야구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매번 쉬는 시간이면 인터넷에서 야구 스코어를 확인하느라 정신없다. 김장생의 시조 ‘십년을 경영하여’를 읽고는 드디어 자기가 좋아하는 두 가지, 야구와 먹거리를 멋지게 조합시킬 꾀를 내놓았다.
김장생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간 지어 내니
반간은 청풍淸風이오 반간은 명월明月이라
강산江山을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야구장 위 집 | 심어진
십년 일해 부동산에 달려가서 땅을 사니
야구장 위 집을 지어 야구도 거져 보고
경기 보며 고기도 구워먹으니 일석이조다
김장생은 십년의 고생으로 초려 한간을 지어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었다. 청풍과 명월과 벗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즐기겠다는 이야기이다. 이 시를 읽고 저마다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지 마음껏 써보라고 했다. 이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과연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아파트 | 박주윤
돈 많이 벌어 놓아 아파트 샀더니
한 방엔 수영장이오 한 방엔 찜질방이다
백년을 살아 두고 두 쓰리라
통나무집 | 박경미십년동안 아름다운 숲속에 통나무집을 지어내니
강아지가 있고 한쪽엔 멋진 침대에 달빛이 들어오니
달빛을 보니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자고 싶구나
마음 | 김우정내 방은 아무것도 없으니 창문만 있으리라
거실은 넓으니 식탁 한 개 밖에 없으리라
우리 집은 휑하니 꼭 내 마음 같으리라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은 굳은 절개를 담아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겠다는 시조를 썼다. 성삼문의 시조를 공부한 친구들은 과연 무엇이 되고 싶다고 했을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성삼문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滿乾坤 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 백설이 만건곤滿乾坤 할 제: 흰 눈이 세상을 덮을 때
* 독야청청獨也靑靑: 홀로 푸르름을 지키겠음
기린 | 김유능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동물원 속에 있는 기린이 되어있어
내 꿈의 키 180을 이루리라
하마 | 유동균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뚱뚱한 하마가 되어있어
그 큰 입으로 하품하고 싶어라
다시 태어나 하마가 되고 싶다는 동균이의 시를 읽고는 배를 잡고 한참이나 웃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시 한편으로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애쓰는 친구들도 가끔은 툭툭 튀어 나온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줌이나 똥 따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원천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턴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세한고절: 추위 속에서도 절개를 지킴
정훈
뒷뫼에 뭉친 구름 앞들에 퍼졌구나
바람 불지 비 올지 눈 올지 서리 올지
우리는 하늘 뜻 모르니 어찌할 줄 모르노라
오줌 | 유동균
오줌이여 너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느냐
아무리 참아 봐도 오줌보는 차오르고
아마도 매일 싸는 건 너뿐인가 하노라
똥과 오줌 | 배평강학교가 끝나고 오는 길에 배가 땡기는 구나
오줌 나올지 방귀 나올지 똥이 나올지 설사 나올지
내 뱃속 뜻 모르니 어찌할 줄 모르노라
박지원의 말을 빌리면 입에 문 밥풀이 벌 때처럼 날아가고, 튼튼한 갓끈이 썩은 새끼마냥 툭 끊어질 만큼 웃긴 시들이다. 개콘 뺨치는 이렇게 재미있는 시가 있는가 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다.
전가팔곡田家八曲 삼三 | 이휘일
여름날 더운 적에 단 땅이 불이로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 흘러 땅에 듣네
어사와 립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꼬* 단 땅이: 달궈진 땅이
* 립립신고: 곡식의 낟알마다에 맺힌 농부의 수고
땀 | 이희재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얼굴에 땀이 바다로다
손 부채질 하자니 힘 빠져서 귀찮네
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알꼬집에 도착하고 나서 손 씻을 마음 없어진지 오래요
바로 시원한 엄마 방에 누워 선풍기 바람 쐬네
땀 말리는 시원함보다 무엇이 부러우랴
더운 날 | 김가을여름날 더운 날에 집 안은 찜통이다
공부방 가자 하니 땀 흘러 옷이 젖네
어서가 선풍기 틀어 가만히 앉아있어 보리라공부방 가니 애들 땀 냄새 진동이다
화장실 가자 하니 발 냄새 진동이랴
빨리 싸고 나가 향수 사서 빨리 뿌리랴
지난여름 더위에 고생하는 상황을 시로 표현해보자고 했다. 흘리는 땀, 녹는 아이스크림, 땀 냄새 등을 가지고 시를 썼다. 이 더운 여름을 도무지 못 견디겠다는 양. 그런데 지은 시를 모아놓고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똑같은 시를 읽고 똑같은 주제를 던져주었는데 한 수업에서는 모두 한결 같이 에어컨을 떠올렸는데 다른 수업에서는 아무도 에어컨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에어컨을 이야기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었다.
가을이 시는 아이들로 가득 찬, 그래서 별의별 냄새가 다 나는 지역 아동센터의 여름 나기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집은 덥고 답답하다. 그래서 공부방에 왔는데 웬걸. 온통 아이들의 땀 냄새에 도무지 갈 곳이 없다. 우연히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여기 냄새는 더 하다. 어서 나가 탈취제라도 뿌리고 싶은 마음이다.
가을이 시를 읽으면 피식 웃게 되지만 한번쯤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생각하게 된다. 다른 예로 외로움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했더니 대부분 친구들이 학원 간 뒤 남은 쓸쓸함을 표현했다. 이들에게 외로움이란 곧 친구 없음이라는 점. 학원에 가지 않는 혹은 가지 못하기에 혼자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4. 시, 이야기하기, 말 걸기
매주 시 한편씩을 받다보니 이제는 꽤 양이 많아졌다. 시를 읽으면서 자연스레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요즘 어떤 마음인지 훤히 알게 되었다.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조그마한 글씨로 공책에 써놓은 시를 종종 걸음으로 가져와 소리내어 읽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친구도 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친구들 앞에서 크게 읽어줄 테지만 시에 털어놓은 속 깊은 이야기는 혼자 읽어보기도 한다. 이건 속삭임 같은 시니까.
좋은 시란 어떤 시일까? 글쎄 모르겠다. 그래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은 시를 읽어보면 이게 좋은 글의 한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있는 그대로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한 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표현한 글. 그래서 원고지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 놓은 글을 읽어보면 시를 쓴 친구들을 하나씩 마주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들은 나에게 말을 건다.
이들의 시를 읽으며 공자가 아들에게 시 공부를 독려하면서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본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벽을 마주한 사람같이 답답이가 된다는 말이. 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을 말로, 글로 옮길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시는 우리를 침묵이 아니라 수다스러운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리라. 이야기를 열어주는 것, 말 걸기. 어떤가, 청소년들이 지은 시를 읽어보니. 이야기할 것이 많아졌는지. 부디 이 시들을 두고 주변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위에 소개된 시를 수다스럽게 큰 소리로 읽어보자. 주변에 듣는 이가 있다면 필히 물어볼 테다. 도대체 그게 무슨 시냐고.
덧: 이 글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주옥(!?)같은 시는 여기에서 더 읽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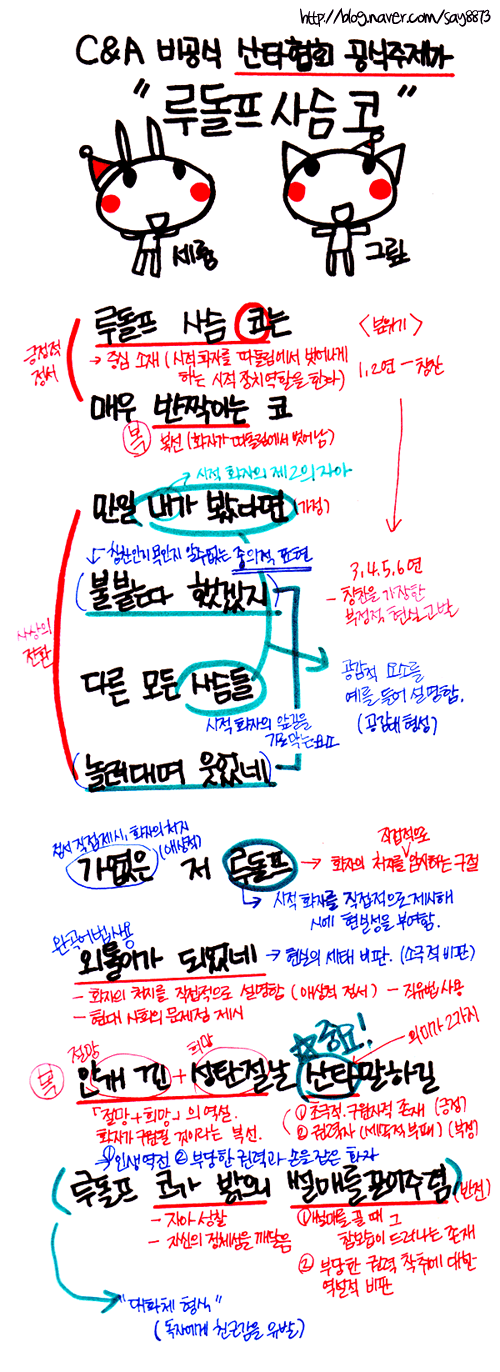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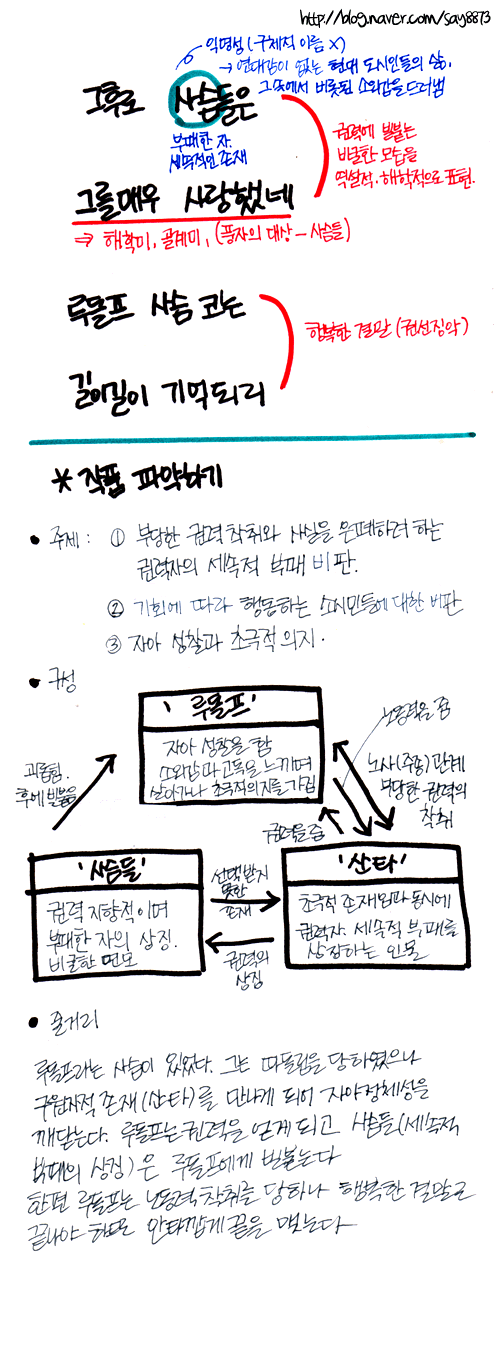


[…] This post was mentioned on Twitter by 기픈옹달, Progress_News. Progress_News said: [수유너머] 시로 말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1. 시를 공부하는 법?? 밑줄 쫘악- 돼지 꼬리 땡땡~ 논어에 보면 공자가 아들 공리孔鯉에게 시 공부를 독려하는 부분이 있다…. http://bit.ly/dCqSOO http://suyunomo.jinbo.net […]
아이들 시를 보며 새삼 ‘시’는 어렵고, 폼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안의 ‘꿈틀들’과 더 가깝게 마주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재밌고 유쾌한 시들, 잘 봤습니다~^^